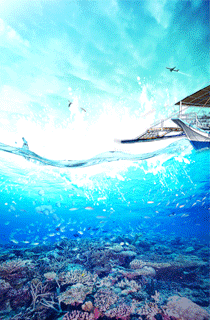<데스크칼럼>미국 트루먼 한국 트루먼
페이지 정보
글쓴이 :본문
미국 사람 가운데서도 평범한 농부 같은 트루먼이 늘 ‘위대한(Great)’ 대통령이나 ‘위대한 대통령에 버금가는(Near Great)’ 대통령으로 꼽히는 걸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자리에는 고정석(固定席)이 세 개 있습니다.
워싱턴•링컨•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대통령 5명을 꼽는다지만, 사실은 마흔 몇 명의 대통령이 남은 두 자리를 놓고 겨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미국 대통령들―케네디에서 클린턴까지는 대개 ‘보통(Average)’ ‘보통 이하(Below Average)’ ‘낙제(Failure)’의 세 단계에 걸려 있습니다.
트루먼(1886~1972)이 미국의 33대 대통령(1945~1953)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물러나고 나서도 그가 훗날 이런 높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내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루먼의 장모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하긴 트루먼의 이력서만 봐서는 그럴 만도 합니다. 그의 비범(非凡)함은 평범(平凡)한 포장지에 꼭꼭 싸여 있었으니까요.
트루먼은 20세기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高卒) 대통령입니다.(그러나 그는 키케로•세네카•카이사르 등의 책을 라틴어로 술술 외웠을 정도로 박식했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진짜 농사꾼 트루먼은 첫 사업이 삐꺽해 당시로는 큰 돈인 3만5000달러의 빚더미에 올라섰던 실패자였습니다.(그러나 그는 부도나 파산 처리로 이 빚을 은근슬쩍 벗어나려 하지 않고 20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나갔습니다) 다섯 살 무렵에 벌써 콜라병 바닥 유리처럼 두꺼운 안경을 썼던 트루먼은 얌전한 색시 같은 사내아이였다고 합니다.(그러나 그는 시력(視力) 검사표를 통째로 달달 외워 징병검사를 통과해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선에서 용맹을 떨쳤습니다)
사실 트루먼이란 시골 무지렁이 출신 재선 상원의원한테 부통령 자리가 돌아간 것부터가 요행이었습니다. 이 요행에 4선 대통령 루스벨트가 취임 82일 만에 덜컥 저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우연이 겹치지 않았더라면 트루먼은 역사의 전면에 나올 기회마저 없었을 것입니다. 루스벨트도 이런 트루먼을 미덥지 않게 보았던 듯합니다. 재임 82일 동안 부통령과의 면담 자리를 딱 2번밖에 만들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도 루스벨트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트루먼이 ‘위대한’ 대통령들의 방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중대한 결단을 바르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원폭 투하, 마셜 플랜, 한국전 참전, 전쟁영웅 맥아더 해임, 군(軍)에서의 흑백차별 철폐, 베를린 공수(空輸), 트루먼 독트린 등 그의 잇단 결단은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결단 중에서 가장 고심했던 것으로 한국전 참전 결정을, 가장 쉽게 내린 결정으론 맥아더 원수 해임을 들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전 참전은 혹시나 3차 세계대전, 그것도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꼬박 밤을 새웠던 데 비해, 맥아더 해임은 그가 아무리 인기가 높다 해도 군의 총사령관은 대통령이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언동을 했으니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트루먼은 대통령이란 헌법 안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뚫어보고 헌법 밖으론 반 발자국도 내밀지 않으려 했던 무서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트루먼의 대통령학(大統領學) 골자는 간단합니다.
첫째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을 골라라’입니다. 심지어 키도 자기보다 큰 사람을 고르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먼의 각료 회의장은 ‘워싱턴의 현인(賢人)’ ‘미국의 영웅’이란 별명을 지닌 장관들로 해서 늘 비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뉴스 해설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입니다. 트루먼은 역사를 바꾼 자기 결정에 대해 군더더기 해설을 덧붙인 적이 없습니다. 셋째 “‘나(I)’라는 말을 가급적 삼가라”는 겁니다. ‘나’를 내세울수록 국민과 멀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단어로 돼 있는 트루먼 취임사에 ‘나(I)’라는 단어는 딱 7번 나온다고 합니다. ‘취임사 중의 취임사’로 꼽힐 정도의 명문인 케네디의 취임사에도 ‘나(I)’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나(I)’라는 말을 내세우는 데 여간 조심스러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의 사정과는 딴판입니다. 지금 굳이 여기서 미국의 트루먼을 돌아보는 것은 한국의 트루먼을 기다리는 부질없는 꿈을 여태 접지 못하고 있는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집위원 장익진 [email protected]
워싱턴•링컨•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대통령 5명을 꼽는다지만, 사실은 마흔 몇 명의 대통령이 남은 두 자리를 놓고 겨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미국 대통령들―케네디에서 클린턴까지는 대개 ‘보통(Average)’ ‘보통 이하(Below Average)’ ‘낙제(Failure)’의 세 단계에 걸려 있습니다.
트루먼(1886~1972)이 미국의 33대 대통령(1945~1953)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물러나고 나서도 그가 훗날 이런 높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내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루먼의 장모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하긴 트루먼의 이력서만 봐서는 그럴 만도 합니다. 그의 비범(非凡)함은 평범(平凡)한 포장지에 꼭꼭 싸여 있었으니까요.
트루먼은 20세기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高卒) 대통령입니다.(그러나 그는 키케로•세네카•카이사르 등의 책을 라틴어로 술술 외웠을 정도로 박식했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진짜 농사꾼 트루먼은 첫 사업이 삐꺽해 당시로는 큰 돈인 3만5000달러의 빚더미에 올라섰던 실패자였습니다.(그러나 그는 부도나 파산 처리로 이 빚을 은근슬쩍 벗어나려 하지 않고 20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나갔습니다) 다섯 살 무렵에 벌써 콜라병 바닥 유리처럼 두꺼운 안경을 썼던 트루먼은 얌전한 색시 같은 사내아이였다고 합니다.(그러나 그는 시력(視力) 검사표를 통째로 달달 외워 징병검사를 통과해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선에서 용맹을 떨쳤습니다)
사실 트루먼이란 시골 무지렁이 출신 재선 상원의원한테 부통령 자리가 돌아간 것부터가 요행이었습니다. 이 요행에 4선 대통령 루스벨트가 취임 82일 만에 덜컥 저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우연이 겹치지 않았더라면 트루먼은 역사의 전면에 나올 기회마저 없었을 것입니다. 루스벨트도 이런 트루먼을 미덥지 않게 보았던 듯합니다. 재임 82일 동안 부통령과의 면담 자리를 딱 2번밖에 만들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도 루스벨트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트루먼이 ‘위대한’ 대통령들의 방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중대한 결단을 바르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원폭 투하, 마셜 플랜, 한국전 참전, 전쟁영웅 맥아더 해임, 군(軍)에서의 흑백차별 철폐, 베를린 공수(空輸), 트루먼 독트린 등 그의 잇단 결단은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결단 중에서 가장 고심했던 것으로 한국전 참전 결정을, 가장 쉽게 내린 결정으론 맥아더 원수 해임을 들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전 참전은 혹시나 3차 세계대전, 그것도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꼬박 밤을 새웠던 데 비해, 맥아더 해임은 그가 아무리 인기가 높다 해도 군의 총사령관은 대통령이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언동을 했으니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트루먼은 대통령이란 헌법 안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뚫어보고 헌법 밖으론 반 발자국도 내밀지 않으려 했던 무서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트루먼의 대통령학(大統領學) 골자는 간단합니다.
첫째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을 골라라’입니다. 심지어 키도 자기보다 큰 사람을 고르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먼의 각료 회의장은 ‘워싱턴의 현인(賢人)’ ‘미국의 영웅’이란 별명을 지닌 장관들로 해서 늘 비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뉴스 해설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입니다. 트루먼은 역사를 바꾼 자기 결정에 대해 군더더기 해설을 덧붙인 적이 없습니다. 셋째 “‘나(I)’라는 말을 가급적 삼가라”는 겁니다. ‘나’를 내세울수록 국민과 멀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단어로 돼 있는 트루먼 취임사에 ‘나(I)’라는 단어는 딱 7번 나온다고 합니다. ‘취임사 중의 취임사’로 꼽힐 정도의 명문인 케네디의 취임사에도 ‘나(I)’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나(I)’라는 말을 내세우는 데 여간 조심스러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의 사정과는 딴판입니다. 지금 굳이 여기서 미국의 트루먼을 돌아보는 것은 한국의 트루먼을 기다리는 부질없는 꿈을 여태 접지 못하고 있는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집위원 장익진 [email protect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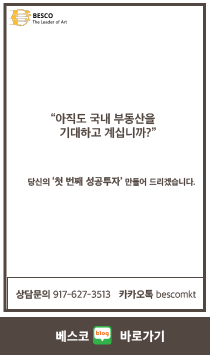
1671333435.jpg)